하도중흥(夏道中興)
후예(后羿)가 태강을 몰아내면서 하나라 최초의 난세(亂世)가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한착이 제상(帝相)을 시해하면서 하도(夏道)가 중간에 단절되었다. 하지만 하도가 중간에 단절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천명(天命)이 바뀐 건 아니었다. 선군(先君 제상)의 아들인 소강(小康)이 하 왕조에 충성스런 제후들 및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단절된 지 40년 만에 마침내 반란을 평정하고 나라를 되찾아 하왕조의 계통을 다시 이었다.
소강의 복국(復國)
소강은 선군인 제상(帝相)의 유복자로 어머니의 나라인 유잉국(有仍國)에서 자랐다. 성장한 후 유잉국에서 ‘목정(牧正)’을 지냈다. 목정이란 가축을 기르는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사서에서는 소강에 대해 “재주와 지략이 뛰어나고 지극한 덕(德)과 인(仁)을 지녔다”고 기록했다.
한착의 아들 오(奡)가 유잉국으로 찾아와 소강을 없애려하자 소강은 유우국(有虞國)으로 도피했다. 유우에서 소강은 포정(庖正 주방책임자)의 직책을 맡았고 또 유우국 군주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 윤성(綸城)에 정착했다. 이때 소강이 관할하던 땅은 불과 십리에 불과했고 인구도 오백 명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소강이 은혜와 덕을 잘 베풀고 지략이 뛰어난데다 사람을 잘 쓰자 아주 신속하게 하나라 사람들의 옹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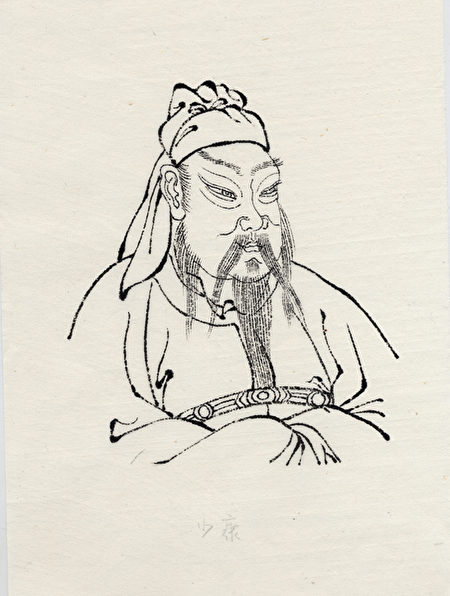
소강(少康) 에포크타임스 삽화
한착이 반란을 일으켜 짐관(斟灌) 및 짐심(斟鄩)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상(相)을 시해했을 때 상의 신하 미(靡)가 유격씨(有鬲氏)에게 달아났다. 이후 40년간 미는 유격 등에서 시기를 기다리며 단 하루도 하나라를 잊은 적이 없었다.
기원전 2079년(소강 40년) 미가 짐관・짐심 두 나라의 남은 부락을 정비하고 소강을 천자로 받들어 한착을 토벌하는 군사를 일으켰다. 소강은 한착의 아들 오(奡 또는 요澆라고도 한다)와 희(豷)를 주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소강의 신하 여애(女艾)가 오를 봉국인 ‘과(過)’에서 멸망시키고 소강의 아들 계저(季杼 또는 후저后杵)가 희를 봉국인 ‘과(戈)’에서 멸망시켰다. 유궁씨(有窮氏)는 이로 인해 마침내 멸망했다. 소강은 하도가 단절된 지 40년 후에 비로소 나라를 되찾았다.
소강의 중흥은 약 100년간 하나라를 어지럽혔던 예착(羿浞 후예와 한착)의 난을 종식시켰다. 그중에서도 한착이 상을 시해한 후 소강이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하도가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40년에 달했다. 하나라의 주인이 된 소강은 곤경하고 어려울 때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적을 없애고 나라를 회복했으니 이는 진실로 소강의 공이며 대우의 덕(德)을 다시 일으켰다. 대우가 물을 다스린 것은 “천지만물의 질서를 회복”한 큰 공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밝은 덕이 널리 퍼져 복택(福澤)이 후세에까지 이르게 된다. 때문에 하나라의 계통이 거의 단절되었을 때 또 다시 이어진 이것은 천명(天命)으로 권신(權臣)들이 난을 일으켜 일시적인 도적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하나라 유신(遺臣) 미(靡)는 소강이 나라를 되찾는 것을 도왔고 짐관과 짐심・유잉・유격・유우씨 등 역시 충의를 더했다. 또 후예, 한착, 요 등 몇몇 난신적자(亂臣賊子)의 형상 역시 역상에 일종의 반면적인 참조를 남겨주었다. 800여 년 후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은 이 당시 역사에 대해 《이소》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예(羿)는 음탕하게 놀며 멋대로 사냥에 빠졌으니 여우 사냥을 좋아했다네.
진실로 도리를 어지럽히면 좋은 종말 드물다더니 한착(寒浞) 역시 그 집을 탐했다네.
요(澆)는 몸에 강한 힘을 지녔지만, 멋대로 죽이고 참지 못했네.
날마다 편히 즐기며 자신을 잊더니 그 목이 떨어져 뒹굴게 되었구나.
羿淫遊以佚田兮,又好射夫封狐。
固亂流其鮮終兮,浞又貪夫厥家。
澆身被於強圉兮,縱欲殺而不忍。
日康娛以自忘兮,厥首用夫顛隕.”
이 작품은 예의 향락과 한착의 탐욕과 악랄함 및 요의 포악한 모습을 아주 생생히 그려냈다.
하도중흥(夏道中興)
하후씨(夏后氏)는 태강이 덕을 잃은 이래 이족(夷族)이 반란을 일으키자 만방(萬邦)이 조현하던 일통의 성대한 상황을 이미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소강이 나라를 되찾은 후 하나라의 계통을 잇고 법도(法度)를 바로 잡으며 대우가 정해놓은 오복(五服)제도에 따라 하자 천하는 다시 질서를 회복했다.
이외에도 소강은 대우에 대한 제사를 대를 이어가며 지낼 수 있도록 아들 하나를 대우의 능묘가 있는 월(越) 땅에 봉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무여(無餘)다. 무여는 봉국을 받은 후 현지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다. 당시 조공(朝貢)으로는 겨우 종묘의 제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라서 무여는 백성들을 이끌고 산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고 새와 짐승을 사냥해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무여는 이렇게 질박한 생활을 살았기에 거처도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일반 백성들과 같았다. 매번 봄가을이 되면 무여는 우임금의 능묘가 있는 회계(會稽)에서 대우에 대한 장중하고 공경한 제사를 올렸다.
소강은 우에 대한 제사를 이을 수 있었고 또 대우가 남겨놓은 기업(基業)을 계승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내조하고 사방의 이민족들이 손님으로 찾아와, 악무(樂舞)를 바치며 하도(夏道)를 함께 받들었으며 대를 이어가며 하 천자의 교화에 복종했다.

사이언스지 최신호는 4000년 전 중국의 대홍수와 대우의 치수를 실증하는 연구논문을 실었다.(Gisling/ 위키피디아 제공)
제저와 제공갑 및 제계
소강이 붕어한 후 하나라 천자의 자리를 11명이 이었다. 즉 제저(帝杼), 제괴(帝槐), 제망(帝芒), 제설(帝泄), 제불강(帝不降), 제경(帝扃), 제근(帝廑), 제공갑(帝孔甲), 제고(帝皋), 제발(帝發), 제계(帝癸)다. 이 11제(帝) 중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이가 셋이다.
하나는 하나라 제7대 군주이자 소강의 아들인 제저(帝杼)다. 그는 사서에 저(杼) 또는 저(予 역주: 보통 여로 읽지만 여기서는 저로 읽어야 한다)나 계저(季杼)로 기록되어 있다. 계저는 갑옷과 창(矛)을 만들어 군대의 전투능력을 향상시켰다. 소강이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계저는 한착의 아들 희를 멸망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국어(國語)》에서는 저에 대해 “우를 잘 따른 이(能師禹者也)”라고 평가했다. 즉 계저는 단순히 소강이 나라를 되찾도록 보좌했을 뿐만 아니라 천자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대우의 홍대(洪大)한 공업(功業)을 계승하고 수호한 명군(明君)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인물은 하나라 제14대 임금인 제공갑(帝孔甲)다. 태강이 하나라 초기에 덕을 잃어 첫 번째 난세를 열었다면 공갑은 정통을 받드는 제사를 모시지 않고 도리어 귀신과 난잡한 신에 미혹되어 여러 제후들이 하후씨의 덕이 쇠퇴했다고 여겨 앞 다퉈 배반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라의 두 번째 난세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하 왕조는 이번 쇠퇴를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없었다. 반대로 천명(天命)을 지니고 장차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는 탕(湯)이 공갑 27년(즉 기원전 1853년) 태어났으니 그는 바로 상(商)나라 임금 계(癸)의 아들이었다.
한편, 공갑이 세상을 다스릴 때 또 두 마리 용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유루(劉累)란 사람이 공갑을 대신해 용을 길렀다. 어느 날 두 마리 용이 뜰에서 서로 싸우다가 암컷이 죽었다. 유루는 이 암컷용의 고기를 가져다 공갑에게 바쳤다. 용이 뜰에서 싸워 서로 다투다 죽고 또 이 용을 사람에게 먹였으니 대하(大夏) 왕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모두 상서롭지 못한 징조였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인물이 바로 하나라 마지막 임금인 제계(帝癸)다. 제계는 또 하걸(夏桀 걸왕)로도 불리는데 가천하(家天下)가 출현한 이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어리석고 난폭해 나라를 망친 군주가 되었다. 후세에 나라를 망친 폭군의 대명사로 늘 하나라 걸왕(桀王)과 상나라 주왕(紂王)을 병칭했다.
하나라 걸왕이 무도하자 기원전 1765년(걸왕 52년) 성탕(成湯)이 군사를 이끌고 걸을 주벌해 걸을 남소(南巢)로 쫓아냈다. 대하는 이에 이르러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났으니 전후 17명의 임금이 4백여 년을 지속했다.
참고문헌:
1. 《강감이지록》
2. 《사기삼가주》
3. 《역사(繹史)》
4. 《한서》
원문위치: https://www.epochtimes.com/gb/17/3/18/n8939403.html
